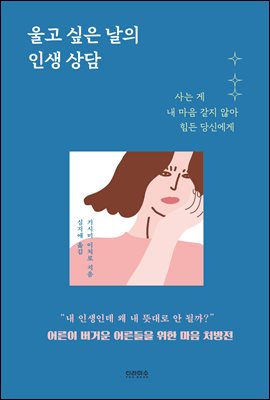난생처음 내 책 - 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
- 저자
- 이경 지음
- 출판사
- 티라미수 더북
- 출판일
- 2021-03-04
- 등록일
- 2021-11-1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8K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바보 같아 보인대도 포기하지 않아요.
‘확률’ 속에는 ‘가능성’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계속 쓰고 두드려 이룬 작가 입성기
책을 읽지 않는 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글쓰기와 출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글쓰기 아카데미의 성행과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독립출판 붐, 그리고 ‘잊고 있던 작가의 꿈을 펼쳐보라’며 글쓰기를 부추기는 플랫폼의 성공까지 곳곳에서 글을 한번 써보라고, 책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며 집필 욕구를 북돋는다. 하지만 책 내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냐 하면-- 솔직히 그렇지는 않다. 독립출판은 독립출판대로, 공모전이나 출판사 투고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존재한다. 수년간 공모전에 매달렸지만 결국 당선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고, 수백 군데 출판사에 투고했지만 아무 데서도 화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많다. 그럼에도 그저 글쓰기가 좋아서 글을 쓰고 작가를 꿈꾸고 어딘가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생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분명 존재한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직접 옮긴 이들의 이야기를 담백하면서도 경쾌하게 담아내는 ‘난생처음 시리즈’의 네 번째 책, (난생처음 내 책)은 이처럼 글을 쓰고 책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출간을 둘러싼 생생한 경험담을 건넨다. 책에는 제목 그대로 ‘내 책’을 만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출간 전후의 에피소드가 가감 없이 생동감 있게 담겼다. 예순여섯 곳의 출판사에 투고한 끝에 메타소설인 첫 책을 출간하고, 에세이인 두 번째 책은 스물네 곳의 문을 두드린 끝에 출간해낸 작가답게 출간의 여러 방법 중에서도 ‘투고’를 통해 편집자를 만나고 출간을 해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전한다(이 책 (난생처음 내 책)의 시작도 투고였다).
요즘 많이들 하는 독립출판과 출판사를 통한 출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편집자의 유무’라고 하겠다. 독립출판이 글쓰기, 편집, 디자인, 제작까지 출간 과정 거의 대부분을 손수 해내면서 이른바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격이라면, 출판사에서 편집자는 상쇠가 되어 꽹과리를 치면서 출간 프로세스 전체를 이끌고 출간이라는 긴 여정을 작가와 함께해준다. 편집자는 투고 원고가 넘어야 할 첫 관문이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글쓴이의 둘도 없는 조력자이자 같은 편이 되는 것. 그렇기에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는 것은 담당 편집자를 만났다는 뜻이고, 그와 한편이 되어 각박한 출판시장에서 출간이라는 다정한 모험을 해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책의 부제가 ‘내게도 편집자가 생겼습니다’인 이유다.
글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수줍게도 ‘제 꿈이 작가였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전하기에 글쓰기 방법론이나 출간 팁을 알려주는 책은 많다. 그렇지만 글이 어떻게 물성을 지닌 책으로 변모해나가는지, 글쓴이와 출판사 사람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원고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독자를 만나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책은 없다. 글이 글쓴이를 떠나 독자를 만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과 그 여정이 때로 뭉클하게 때로 유쾌하게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것은 이 책만의 미덕이다. 글의 힘을 믿는 사람, 글 읽기를 좋아하고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혹은 책을 한번 내볼까 싶은 사람, 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재미있게 읽는 가운데 어떤 자세로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투고를 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자그마한 힌트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 책 쓰기에 진심이신 분,
여기 여기 붙으세요!
쓰고 만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의 진득한 진심
출판사의 홈페이지나 판권 정보를 보면 ‘여러분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누구에게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등등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투고를 하면 편집자가 검토한 후, 원고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출간을 고려해보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투고를 해서 출간계약을 맺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안타깝지만 많은 투고자가 ‘저희 출판사와 출간 방향이 맞지 않아 함께할 수 없다’는 틀에 박힌 반려 답장을 받는다. 그렇다고 투고 원고의 채택 확률이 한없이 제로에 가깝냐 하면 그럴 리가. 다수의 출판사가 탐을 내면서 먼저 계약하려고 속도전을 벌이는 투고 원고도 있다. 투고자에게 출간이 간절하듯 편집자도 좋은 원고에 목말라하기 때문이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다. 분명 글은 좋은데 시장 상황상 판매를 자신할 수 없거나, 독자 반응을 가늠하기 어렵거나, 조금 방향을 틀면 좋을 법도 한데 그럴 수 있을지 판단하기 애매할 때가 그렇다. 그런 속사정을 구구절절 속속들이 말하기 어려울 때도 편집자는 ‘출간 방향과 맞지 않다’는 단골 멘트를 쓰곤 한다. 하지만 그 애매함을 뚫고 가능성을 믿고 손을 내미는 편집자도 있다. 그럴 때 그 편집자는 이 책에 쓰인 표현처럼 예비 작가에게 ‘구원의 천사’가 되어준다. 편집자는 자신이 본 원고의 가능성을 갈고닦아가며 출간이라는 모험을 기꺼이 작가와 함께한다. 이 책 (난생처음 내 책)의 저자도 데뷔작을 그렇게 출간했다.
책에는 구원의 천사와도 같은 좋은 편집자뿐만 아니라 나쁜 편집자, 이상한 편집자도 등장한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출판계 버전이다. 초판 인세는 없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편집자,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글을 마음대로 윤문, 윤색한 편집자 등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러나 편집자 대부분은 책 말고도 볼거리가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도 글을 사랑하고 책이라는 매체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일면 바보 같은 이들이기도 하다. 글을 쓰고, 책을 내고자 하고, 책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어쩌면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책에 알알이 박혀 있는 그런 진득한 진심이야말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글을 쓰고 책을 내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지도 모른다.
‘책 한번 써볼까’ 생각만 했던
당신 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유쾌하고도 뭉클한 원고의 여정
(난생처음 내 책)은 ‘이거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책을 써도 될까요?’라고 망설이는 사람에게 그 못지않게 소심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요, 저도 썼는걸요. 외롭고 슬플 때도 많지만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해봅시다’라고 시종일관 조곤조곤 이야기한다. 글을 쓰고 편집자를 만나고 책을 내고 그리하여 독자에게 이르는 일, 그러니까 난생처음 내 책을 내는 일은 꽤 괜찮은 일이라고.
글을 쓰는 동안 시시때때로 마주치는 막막함과 그것을 견뎌내고 글을 완성했을 때의 희열, 여러 군데 투고하고 마주쳤던 일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엎어진 일, 첫 계약을 맺었을 때의 설레고 벅찬 기분,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제안을 받았다가 없던 일이 되어버린 일, 마침내 내 책이 나와 서점에서 독자가 내 책을 선택하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 꿈을 이뤄나가는 동안 마주칠 수 있는 온갖 미묘하고 복잡다단한 감정을 작가는 섬세하게 포착해 책 갈피갈피에 살포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경험과 감정 사이사이에 투고 방법, 투고 채택률, 투고할 때의 체목, 계약, 편집 및 교정 교열 과정, 제목 결정, 보도자료,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 작가 지망생이라면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독자에게 가닿는지를 헤아려볼 수 있다.
앞서 출간한 두 권의 책과 더불어 이 책 (난생처음 내 책)의 출간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간간이 들어가 있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특히 책의 말미에는 이 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투고 메일과 기획서가 부록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어, 책의 출발점까지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글쓰기의 기쁨과 슬픔을 넘어
어쨌거나 쓰는 이들을 위해
조지 오웰은 글쓰기의 목적으로 순전한 이기심, 미학적 열정, 역사적 충동, 정치적 목적이라는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물론 거창하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책의 저자는 그저 좋아서 쓴다고 말한다. 현실도피, 인정욕구, 기록의 욕망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 다 걷어내면 ‘좋아서 쓴다’는 알맹이만 남는다고. 오랫동안 작가를 꿈꿨고 멈추지 않고 글을 쓴 이답게 곳곳에서 느껴지는 ‘작가란 무엇인가’에 관한 고민은 독자에게 글쓰기와 작가, 책에 대해 한 겹 더 생각해볼 기회를 마련해주기도 한다.
많은 작가가 ‘작가 병’과 ‘내 글 구려 병’을 롤러코스터처럼 오간다고 토로한다. ‘내가 글 좀 쓰지’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왜 이렇게 글을 못 쓰나’ 싶어서 한없이 가라앉는다고. 글쓰기란 오롯이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고, 뭐든 혼자 하는 일에는 늘 ‘확신할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이 따라붙기 때문일 것이다. 편집자는 그런 감정의 널뛰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지극히 주관적인 애정으로 작가의 글쓰기를 독려한다. 작가와 편집자는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이미 한편이므로.
그저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그를 작가라고 불러주는 편집자를 만날 수 있기를, 출간까지 동행할 수 있는 편집자가 그에게 생기기를, 그리하여 저마다의 색깔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세상에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젠가는’을 ‘지금 내 곁으로’ 데려다주는 [난생처음 시리즈] 4권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은데 선뜻 시도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있죠.
먼저 경험하고, 그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언젠가는’이 조금이나마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난생처음>은 ‘언젠가는’을 ‘지금 내 곁으로’ 데려다주는 에세이 시리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