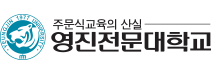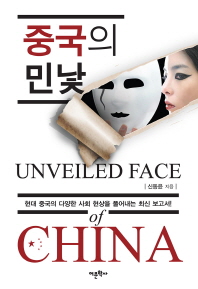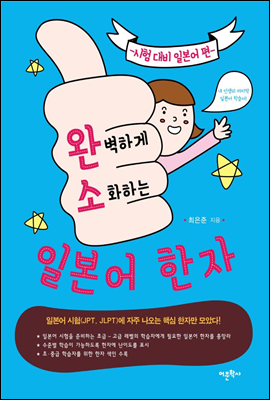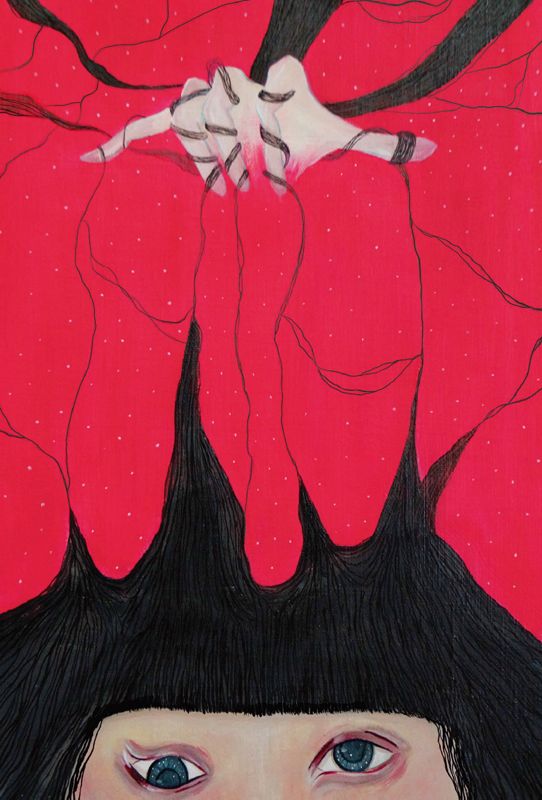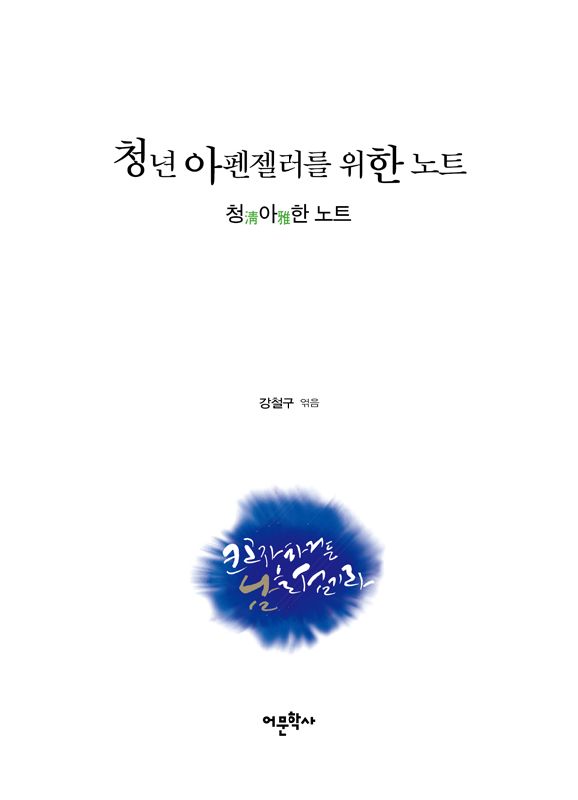상세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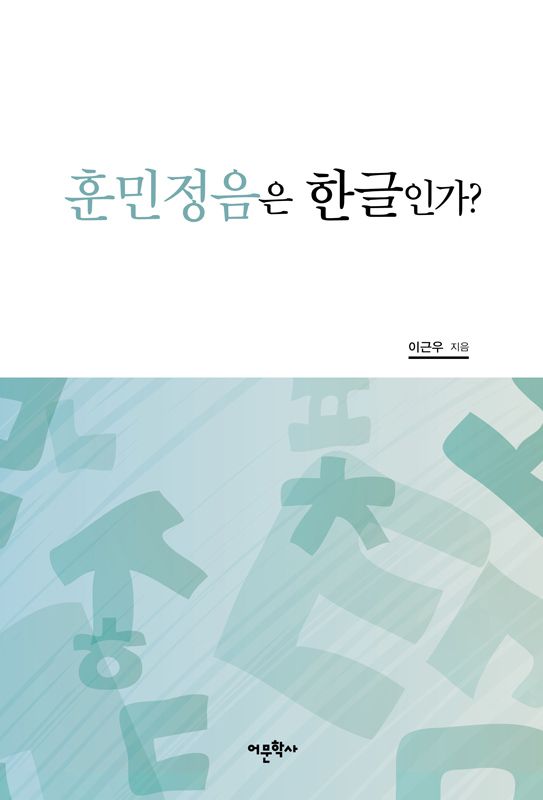
훈민정음은 한글인가?
- 저자
- 이근우
- 출판사
- 어문학사
- 출판일
- 2017-01-11
- 등록일
- 2018-01-1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영풍문고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한글의 원형은 훈민정음이 아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 책은 이제까지 우리글의 원형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훈민정음 이전에 창제된 언문이 우리글의 시초이며 훈민정음은 한자 음가를 표기하기 위해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언문이야말로 우리글의 원형임을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우리글의 공식 명칭은 훈민정음이 아닌 언문이며, 또한 한글의 원형이라는 도발적이기까지 한 결론에 다다른다.
우리글의 원형이라 알려진 훈민정음과 이를 낮춰 부른 것이라고 알려진 언문이 엄연하게 다르다는 전제가 새롭다. 언문이 우리글의 시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토대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간다.
언문과 훈민정음을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의 의도를 바르게 읽어내는 방법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글인 한글을 제대로 알고 언문에 대한 연구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