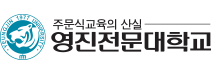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
- 저자
- 장승욱
- 출판사
- 하늘연못
- 출판일
- 2016-10-26
- 등록일
- 2017-10-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64KB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한습, 두습, 사릅, 나릅, 혹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는가. 낯설게 들리겠지만 순우리말로 마소나 개의 나이를 가리키는 어휘들이다. 내친 김에 열까지 헤아려 보자. 한습(한 살), 두습(두 살), 사릅(세 살), 나릅(네 살), 다습(다섯 살), 여습(여섯 살), 이롭(일곱 살), 여듭(여덟 살), 아습(아홉 살), 열릅(열 살). 이 책을 넘기는 독자들 가운데 아마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 한데 이중 유독 ‘내일(來日)’만은 왜 한자어일까. 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말은 없는가 하는 의문을 품은 적은 없는가. 이 의문의 답은 ‘올제’이다. 그렇기에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글피가 아니라 어제, 오늘, 올제, 모레, 글피로 써야 올바른 우리말 표기가 된다.
익혀 두고 새겨 두고 앙구어 두었다가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우리말 도사리들을 몇몇 더 열거해 보자. 순우리말로 외양만 차리고 실속이 없는 사람은 ‘어정잡이’, 못된 짓을 하며 마구 돌아다니는 사람은 ‘발김쟁이’, 조금도 빈틈이 없이 야무진 사람은 ‘모도리’, 제멋대로 짤짤거리고 쏘다니는 계집아이는 ‘뻘때추니’라 한다. ‘꽃잠’은 신랑 신부가 맞는 첫날밤의 잠, ‘사로잠’은 불안 때문에 깊이 들지 못한 잠, ‘단지곰’은 무고한 사람을 가둬 억지로 자백을 받아 내는 일, 국이나 물이 없이 먹는 밥은 ‘강다짐’, 남이 먹다 남긴 밥은 ‘대궁밥’, 반찬 없이 먹는 밥은 ‘매나니’라 한다. ‘도리기’는 여럿이 추렴하여 나누어 먹는 일, ‘시게전’은 곡식을 파는 저자, ‘바라기’는 ‘보시기’보다 입이 훨씬 더 벌어진 반찬 그릇을 말한다. ‘드팀전’은 피륙을 파는 곳, 건어물 가게는 ‘마른전’, 반대로 말리지 않은 어물을 파는 곳은 ‘진전’, ‘배동바지’는 벼가 알을 밸 무렵, ‘새물내’는 빨래해서 갓 입은 옷에서 나는 냄새를 뜻한다.
이 책 『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은 우리 삶과 관련된 의식주, 생활도구, 언어습관, 자연환경, 그리고 사람과 세상살이 속에 깃들여 있는 겨레말의 어휘와 그 풀이를 담아 잊혀져 가거나 잘 모르기에 제대로 쓰지 못했던 이들 아름다운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새와 그 가치를 전한다. 책의 표제에 쓰인 ‘도사리’는 익는 도중에 바람이나 병 때문에 떨어진 열매를 가리키는 순우리말, 한자로는 낙과(落果)라고 한다. 지은이는 십 년 넘게 이른 새벽 과원(果園)에 나가 이들 도사리들을 줍는 심정으로 순우리말 25,000여 개의 어휘를 모아 우리말의 본뜻과 속뜻, 그것들의 올바른 쓰임을 전한다.
잡살전, 바리전, 엉너리, 야마리, 개호주, 능소니, 굴퉁이……, 듣는 이에 따라 생경하게 여겨지겠지만, 이를 풀이하면 잡살전은 씨앗을 파는 가게, 바리전은 놋그릇 파는 가게, 엉너리는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벌쩡하게 서두르는 짓, 야마리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개호주는 호랑이의 새끼, 능소니는 곰의 새끼, 굴퉁이는 겉은 그럴 듯하나 속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제껏 모르기에 올바로 써보지 못한 생소한 우리말 어휘들, 또는 알고는 있지만 이때껏 그릇되게 사용해 온 순우리말 어휘들의 세세한 풀이를 통해 이 책은 우리말이 주는 깊은 정감과 녹록찮은 겨레얼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책의 꾸밈은 크게 ‘도사리 편’(알기 쉬운 설명을 담은 순우리말 뜻풀이글)과 ‘말모이 편’(갈무리한 순우리말 어휘사전) 두 갈래로 나뉜다. 아래에 ‘도사리 편’의 풀이글 세 꼭지를 소개해 본다.
어떤 일이 시작되는 머리를 첫머리, 들어가는 첫머리를 들머리, 처음 시작되는 판을 첫머리판이라고 한다. 어떤 일의 첫머리를 뜻하는 첫단추, 맨 처음 기회를 뜻하는 첫고등, 맨 처음 국면을 뜻하는 첫밗 같은 말들도 모두 일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일을 할 대강의 순서나 배치를 잡아 보는 일, 즉 설계를 하는 일은 얽이라고 하는데, 동사로는 ‘얽이친다’고 한다. 얽이에 따라 필요한 사물을 이리저리 변통하여 갖추거나 준비하는 일은 마련이나 장만, 채비라고 한다. 앞으로의 일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은 ‘징거둔다’, 여러 가지를 모아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엉군다’, 안 될 일이라도 되도록 마련하는 것은 ‘썰레놓는다’고 말한다. 진행되는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단단히 단속하는 일이 잡도리인데, 설잡도리는 어설픈 잡도리, 늦잡도리는 뒤늦은 잡도리다. 아랫사람을 엄하게 다루다가 조금 자유롭게 늦추는 일을 ‘늑줄준다’고 하고, 늑줄을 주었던 것을 바싹 잡아 죄는 일은 다잡이라고 한다. 감장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힘으로 꾸려 가는 것이고, 두손매무리는 일을 함부로 거칠게 하는 것, 주먹치기는 일을 계획 없이 그때그때 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남의 일을 짓궂게 훼방하는 짓은 헤살이라고 하고, 돼 가는 일의 중간에 방해가 생긴 것은 ‘하리들었다’고 한다. 일이 돼 가는 형편을 매개라고 하는데, 매개가 제법 좋은 것은 ‘어숭그러하다’, 매개가 안 좋아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거나 포기한 것은 ‘반둥건둥했다’, ‘중동무이했다’, 일을 망쳐 버린 것은 ‘털썩이잡았다’, ‘허방쳤다’고 표현한다. (<들머리와 들머리판>, 142쪽)
바라지는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바람벽의 위쪽에 낸 작은 창을 뜻하는 말인데, 옥바라지나 해산바라지와 같이 음식이나 옷을 대어 주거나 일을 돌봐 주는 일도 바라지라고 한다. 바라지를 통해 들어오는 한 줄기 햇빛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함과 위안을 주는 것이 바라지인 것이다. 뒤에서 하는 바라지는 뒷바라지다. 바라지와 비슷한 말로는 치다꺼리가 있는데, 입치다꺼리는 먹는 일을 뒷바라지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바지는 공헌(貢獻)과 같은 뜻으로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물건을 갖춰 바라지하거나 음식 같은 것을 정성 들여 보내 주는 일, 또 그렇게 보내는 음식을 뜻하기도 한다. 이바지는 ‘이받다’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받다’는 이바지하다, 바라지하다, 잔치하다 같은 뜻을 가진 말이다. 그래서 전에는 잔치를 이바디, 대접할 음식을 이바돔이라고 했던 것이다. 뒷바라지가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몸이 아파 누워 있는 병자들일 것이다. 옆에서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해 주는 일을 수발이나 시중이라고 하는데, 병자에게 시중이나 수발을 드는 일을 병시중, 병수발 또는 병구완이라고 한다. 구완은 구원(救援)에서 나온 말이다. 병구완을 뜻하는 말에는 고수련이라는 예쁜 말도 있다. 겨드랑이를 붙들어 걸음을 돕는 일은 곁부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을 돕는다는 일이 어떻게 늘 즐겁기만 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질구레하고 지저분한 뒷바라지 일을 뜻하는 진구덥, 귀찮고 괴로운 남의 뒤치다꺼리를 가리키는 구듭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다. (<바라지와 이바지>, 145쪽)
재주아치는 재주가 많은 사람, 슬기주머니는 유달리 재능이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 대갈마치는 세파를 겪어 아주 야무진 사람, 모도리나 차돌도 조금도 빈틈이 없이 야무진 사람을 뜻한다. 성질이 야무지고 독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감당해 내는 사람은 벼락대신으로 부른다. 꾀가 많은 사람을 꾀보라고 하는데, 비슷한 말로는 꾀쟁이?꾀자기?꾀퉁이 같은 것들이 있다. 윤똑똑이는 저만 잘나고 영리한 체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보통내기나 여간내기?예사내기는 그냥은 쓰이지 않고 반드시 뒤에 ‘아니다’라는 말이 덧붙어 보통이나 여간 또는 예사가 아닌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말들이다. 가르친사위는 독창성이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꼭두각시나 망석중이와 비슷한 말이다. 데림추나 어림쟁이, 코푸렁이도 주견이 없이 남에게 딸려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는 말들인데, 코푸렁이는 코를 풀어 놓은 것과 같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무지러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물건을 무지렁이라고 하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도 무지렁이라고 한다. 짐승의 맨 먼저 나온 새끼를 뜻하는 무녀리는 언행이 좀 모자라는 사람을 가리키고, 전기 절연체로 쓰이는 사기로 만든 통이나 돼지감자를 뜻하는 뚱딴지는 우둔하고 무뚝뚝한 사람을 가리킨다. 못나서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은 똥주머니, 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쑥, 아는 것이 없이 머리가 텅 빈 사람은 깡통이라고 한다. 궁도련님은 호강스럽게 자라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 책상물림이나 글뒤주는 글공부만 하여 세상에 대한 산지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아는 것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은 바사기, 어리석고 고집 센 시골 사람은 시골고라리 또는 줄여서 고라리라고 한다. (<두루치기와 무지렁이>, 340쪽)
읽을수록 흥미진진한 순우리말 풀이의 글 산책이다. 이 산책길을 따라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우리말의 숲속 세계로 좀더 나아가 보자. “안개처럼 가늘게 내리는 안개비, 안개보다는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는개, 는개보다는 굵고 가랑비보다는 가는 이슬비, 이슬비보다 더 굵게 내리는 비가 가랑비. 이것이 빗방울의 굵기에 따른 가는비의 서열이다. 이밖에 실같이 내리는 실비, 가루처럼 뿌옇게 내리는 가루비, 보슬비와 부슬비도 가는비의 한 가지다. 사전에 가는비는 나와 있는데, 굵은비는 없다. 대신 노드리듯 오는 날비, 굵직하고 거세게 퍼붓는 작달비, 빗방울의 발이 보이도록 굵게 내리는 발비, 물을 퍼붓듯 세차게 내리는 억수. 이것들은 장대비, 줄비, 된비, 무더기비 따위와 함께 모두 큰비를 나타내는 이름들이다.” “바람기는 바람이 불어올 듯한 기운, 바람살은 세찬 바람의 기운, 바람씨는 바람이 불어오는 모양을 말한다. 첫가을에 선들선들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건들바람이라고 하는데, 남쪽에서 부는 건들바람은 건들마,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강쇠바람이라고 한다. 부드럽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은 간들바람,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꽁무니바람이고, 이리저리 방향이 없이 막 부는 바람은 왜바람이다. 명주처럼 보드랍고 화창한 바람은 명지바람, 맵고 독하게 부는 찬바람은 고추바람, 비는 안 오는데 몹시 부는 바람은 강바람이라고 한다. 소소리바람은 이른봄에 살 속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고, 살바람은 좁은 틈에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으로 황소바람과 같은 바람이다.”
지은이 장승욱은 우리말 채록 탐구는 물론 이것들에 대한 풀이글을 쓰고 전파하며 올곧은 우리말을 구사해 온 시인, 국어학자이거나 우리말 전공자도 아닌 이가 이 책 『도사리와 말모이, 우리말의 모든 것』에 공을 들인 품이 여간하지가 않다. 이는 지은이가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남북한의 수십 종 국어사전과 어휘.용어사전들을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 듯’ 어느 하루 거르지 않고 낱낱이 독파하며 갈피잡고 채집하고 기록해 온 사라져 가는 우리말의 ‘바른 쓰임 말본새’이다. 지은이는 이런 공로로 지난 2003년 한글문화연대가 제정한 제1회 ‘우리말글작가상’을 수상했다.
온갖 외래어와 파생어와 인터넷 문자들이 속속 우리 일상어로 둔갑하고 또 상징 글꼴(code)로 자리잡을 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말을 밀어내고 있는 지금 시기에, 이 책이 지닌 우리말 우리글을 더 잘 알고, 더 잘 쓰고, 더 잘 퍼뜨리자는 숨은 뜻과 열의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말을 잘 알고 잘 쓰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 어떤 자리에서든 뛰어나게 되어 있다. 본래 말을 잘 안다는 것이 사물의 이치와 근본을 꿰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누천년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무르녹아 여문 풍성한 순우리말 성찬. 좋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의미를 넘어 냉대와 소외, 무관심 속에 퇴색해 가는 우리것 우리얼 찾기의 그 바탕에 놓여져야 마땅한 겨레말 되살림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