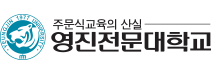즐거운 읍내 - 최용탁 장편소설
- 저자
- 최용탁
- 출판사
- 삶이보이는창
- 출판일
- 2012-08-03
- 등록일
- 2012-12-2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640 Bytes
- 공급사
- 우리전자책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생각하면 이 세상이 아귀다툼으로 살아가는 저잣거리가 아니고 무엇이랴”
최용탁은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이기도 하다. 작가는 “때로는 오일장에서, 혹은 호프집에서 몰래 엿들은 필부필부(匹夫匹婦)의 말들이 이 소설 속 에피소드로 문자의 옷을 입었다”고 말한다. 경험하고 살아본 자만이 그려낼 수 있는 삶의 세목들은 생생하게 꿈틀대고, 이들이 쏟아내는 언어들은 싱싱하게 팔딱거린다. 풍부한 어휘로 이루어진 언어의 향연과 척척 감기는 육감 있는 입말들은 요즘 소설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것이다. 작가는 농촌 읍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에피소드를 그저 걸출한 입담으로 담아내고 풍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얽히고설킨 인간사는 ‘지금-여기의 소읍에 관한 생태보고서’라 할 만큼 날카롭게 포착해내고 있다.
‘백술’의 집안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듯 얽혀 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통속적으로 보이는 집안의 재산 싸움과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파탄, 질척한 성생활, 가족의 붕괴 들은 그대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 된다. ‘백술’이 풍으로 쓰러진 부인을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보내고 둘째 부인인 ‘봉선댁’과 한바탕 정사를 치르는 소설의 도입부는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공동체가 붕괴된 농촌 현실과 농민의 삶 속에 드리운 경제적 모순을 인간의 소외까지 밀고 나간 것이다.
그가 응시하고 있는 읍내는 대도시 못지않은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로 뒤엉켜 있는 살벌한 정글이다. 읍내는 농촌이 산업화 이전의 전통적 삶의 터전에서 개발과 자본의 침투로 사람들이 옮겨온 공간이다. 그곳에서 개발과 자본에 길들여져 몸부림치는 순박하고, 그래서 쉽게 타락한 읍내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